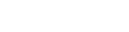학과/분야 뉴스

- 학과 소식
- 학과/분야 뉴스
[기사] 한계없는 AI, 세상에 없던 물질을 내놓다
- 소프트웨어학과
- 2023-12-03

"이제 신소재공학과는 다 망했다."
한 커뮤니티에서 내린 평가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구글과 AI가 해낸 엄청난 일 때문이다. 구글이 11월 29일(현지시간) 네이처에 공개한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AI) 'GNoMe'을 공개했다. GNoMe은 신소재를 생성하는 AI다.
GNoMe은 엄청난 결과를 내놨다. 17일 만에 안정적인 무기화합물 구조 220만개를 생성했고 38만개는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서 합성의 유망한 후보가 됐다. 이번 결과는 약 800년 동안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맞먹는 걸로 평가됐다. AI가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조합이 너무 많은 탓에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기존 구조에 아주 작은 수정을 가해 새로운 조합이 발견되기를 희망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이 작업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긴 마찬가지였다. "운이 좋으면 수 개월, 나쁘면 수 년이 걸린다"는 게 기존의 평가다. 그리고 기존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새 물질을 개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물질도 5만2000여개나 나와
GNoMe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의 다른 딥러닝 모델을 활용했다. 첫 번째는 기존 구조를 수정해 10억 개 이상의 비슷한 형태를 생성했다. 두 번째는 기존 구조를 무시하고 순수하게 화학식에 기초해 무작위적으로 신소재를 생성하고 그 안정성을 예측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결합하고 학습해 확장성을 엄청나게 넓혔다. 이런 과정으로 통해 무언가 새로운 구조가 생성되면 GNoME은 이를 필터링했다. 구조의 분해 에너지 예측을 활용했다. 이는 물질이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안정적인 소재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발견이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물질들이 배터리나 반도체 등 현대 첨단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전도체는 배터리 내 다양한 구성 요소 간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GNoME이 이번에 이뤄 낸 발견 속에는 기존 연구보다 25배나 많은 528개의 리튬이온 전도체 후보가 들어있다. 그 중 일부는 지금의 배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보고 있다.
게다가 초전도체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래핀'과 유사한 화합물도 5만2000가지나 찾았다고 한다. 기존에 확인된 비슷한 화합물은 약 1000개 정도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
[기사] “AI 발전·확산 대응한 첫 국제 규범 합의안 마련”
주요 7개국(G7)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확산에 대응한 첫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2023-12-03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G7 디지털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이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져 있다.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출시 전 적절한 조치 강구 등 AI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에 더해 AI 고유 리스크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향상과 AI 취약성 검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이용자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의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부여해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riginator Profile·OP)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합의안은 이달 개최될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은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문 : “AI 발전·확산 대응한 첫 국제 규범 합의안 마련” | 세계일보 (segye.com)
-
[기사] 엔씨소프트 TL, 12월 7일 정식 서비스 시작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다음달 7일 오후 8시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쓰론앤리버티(TL)’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3-12-03
TL 개발을 총괄하는 안종옥 PD가 다섯 번째 ‘프로듀서의 편지’를 통해 론칭 일정을 공개했다. 안종옥 PD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최대한 많은 이용자가 함께 TL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인 오후 8시에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이용자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부터 론칭 클라이언트를 사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종옥 PD는 “클라이언트 용량이 큰 만큼, 론칭과 함께 모두 같이 플레이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두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12월 3일 저녁 12시까지 사전 캐릭터 생성도 가능하다.
원문 : 엔씨소프트 TL, 12월 7일 정식 서비스 시작 - ZDNet korea